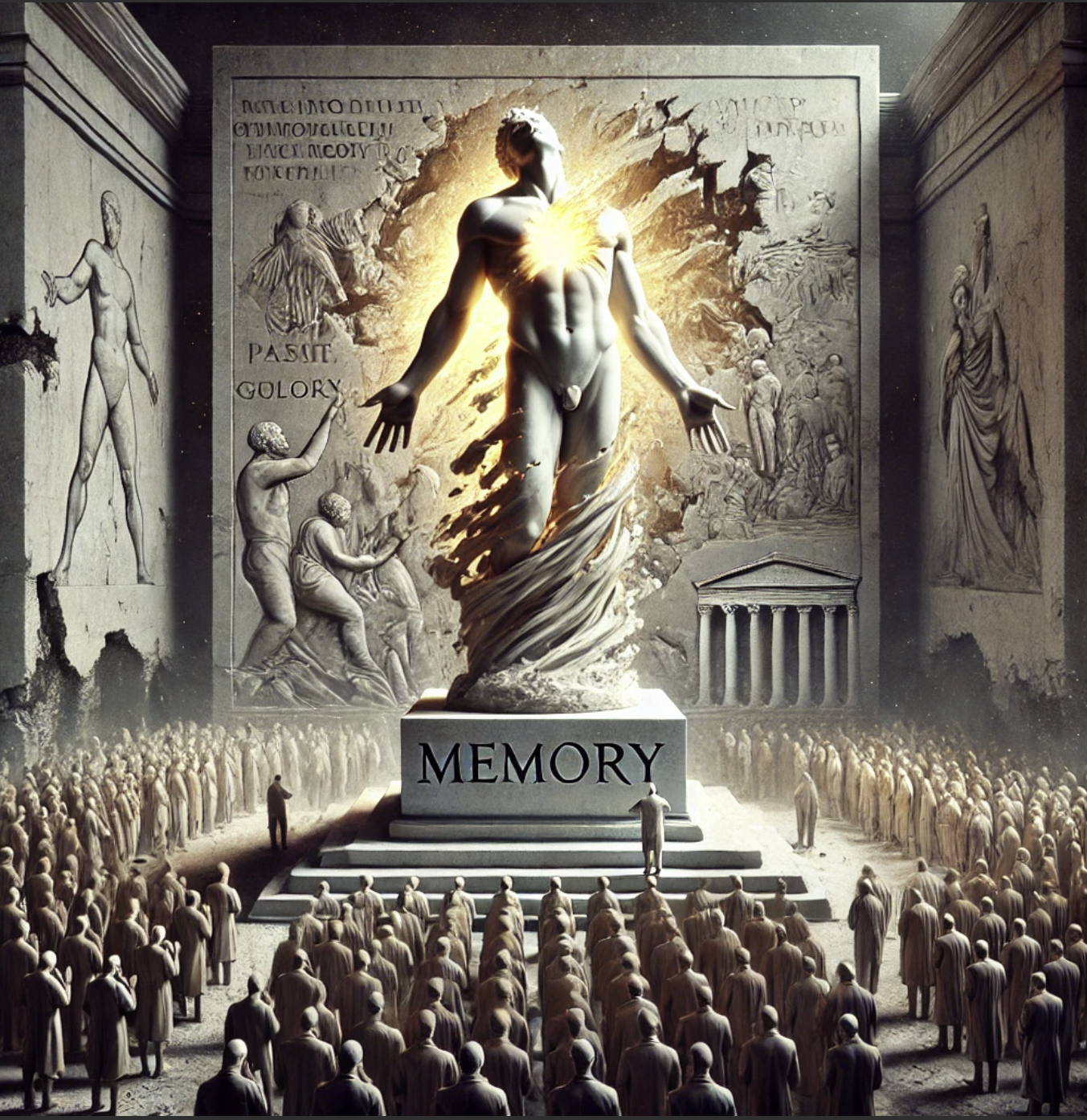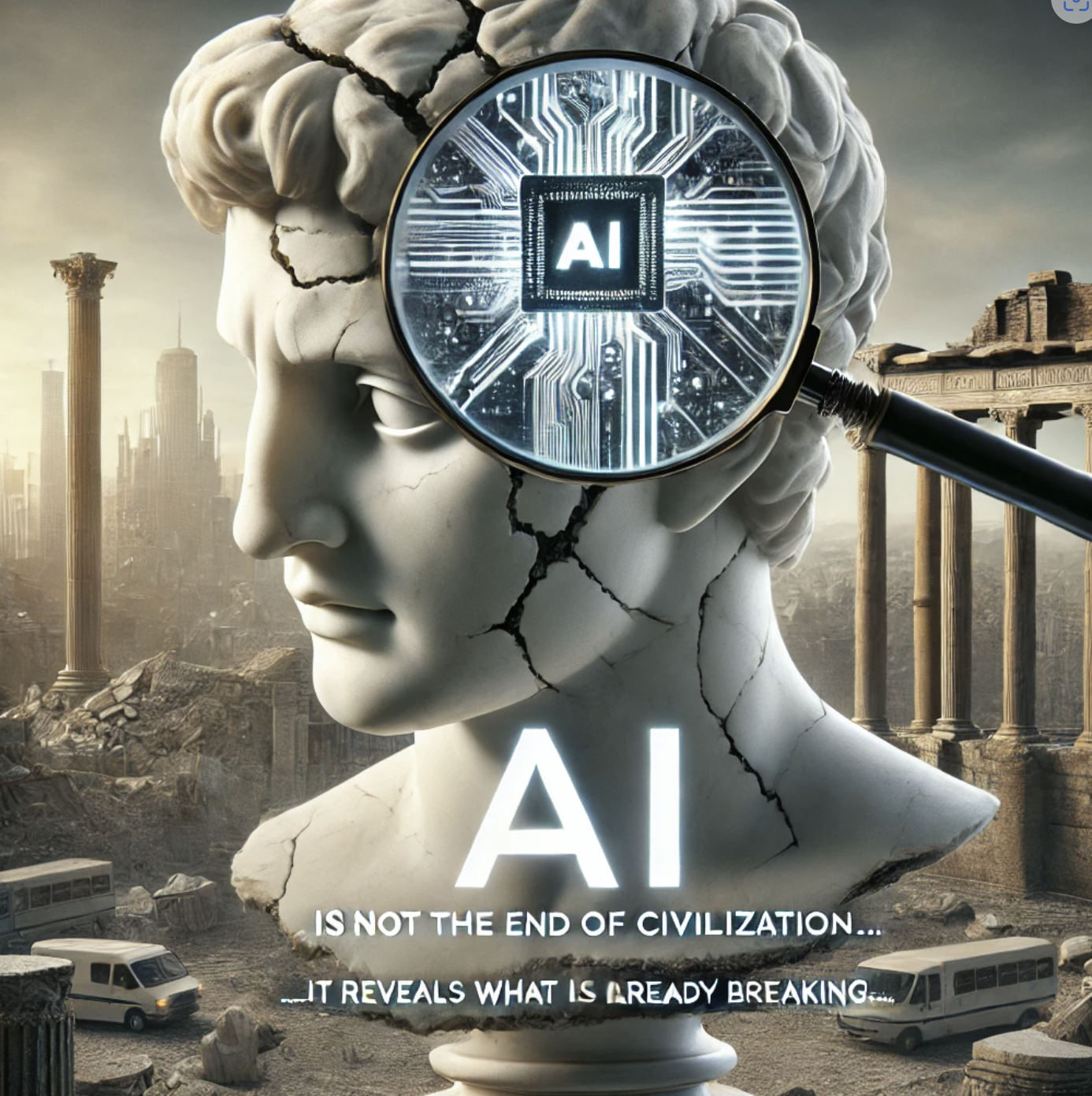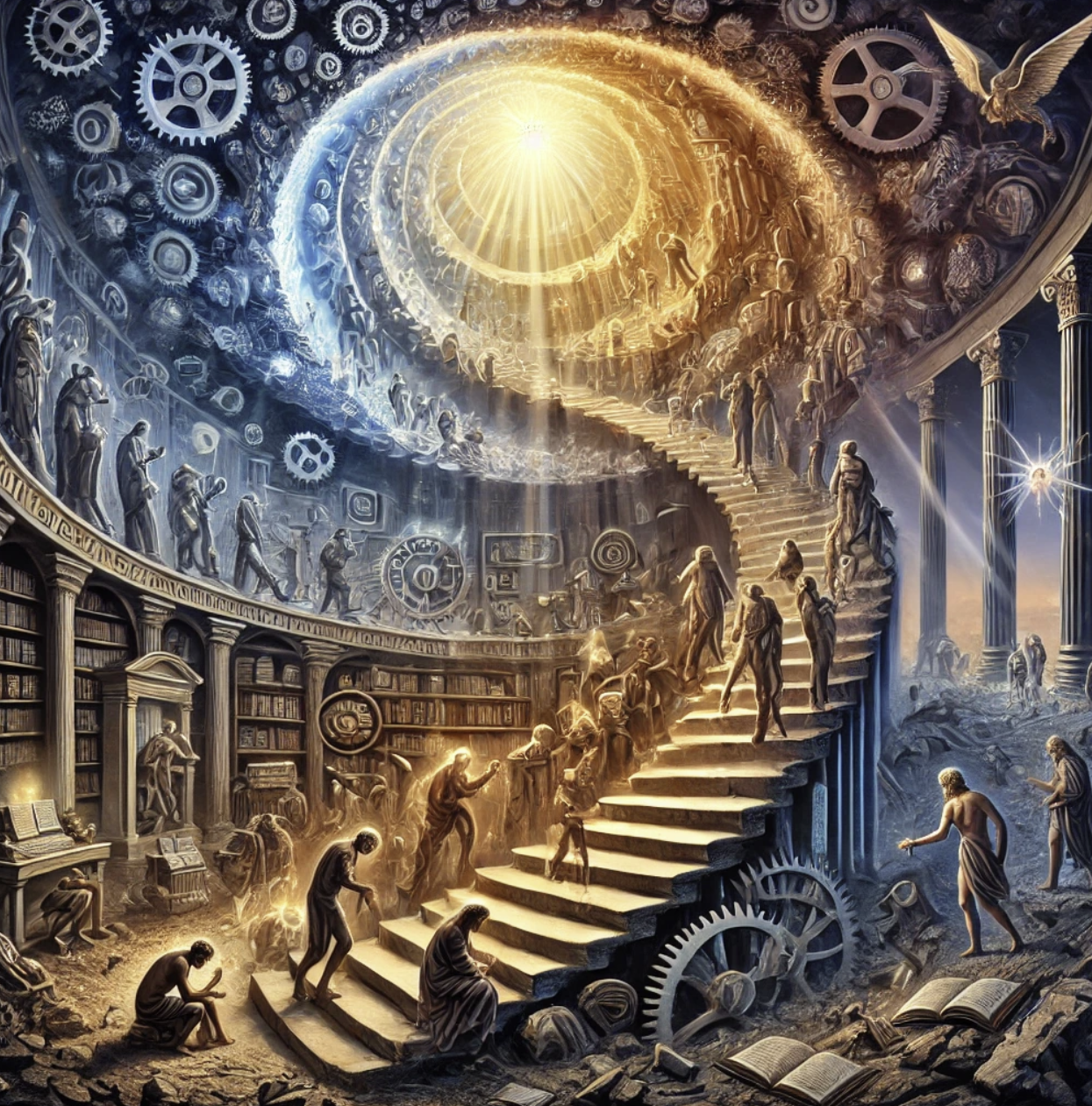기술에 대한 맹목적 숭배가 어떻게 문명의 붕괴를 이끌었는지, 고대에서 현대 전쟁까지의 사례를 통해 토인비가 설명한 심오한 통찰을 탐구한다.🧠 서 : 골리앗 신화에 숨은 비극적 교훈전통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"약자가 강자를 이긴" 상징으로 해석된다. 그러나 아널드 토인비는 이 고전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. 그는 이 이야기에서, 과거의 성공적 기술에 집착한 자가 결국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'기술 숭배의 아이러니'를 읽어낸다. 토인비는 이 교훈을 단순한 고대 설화가 아니라, 인류 문명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으로 확장시킨다.⚔️ 1. 기술의 우상화: 골리앗의 몰락골리앗은 창과 갑옷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, 자신이 무적이라 믿는다. 그는 상대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무장했을 거라 전제하고 싸움..